아주 편안한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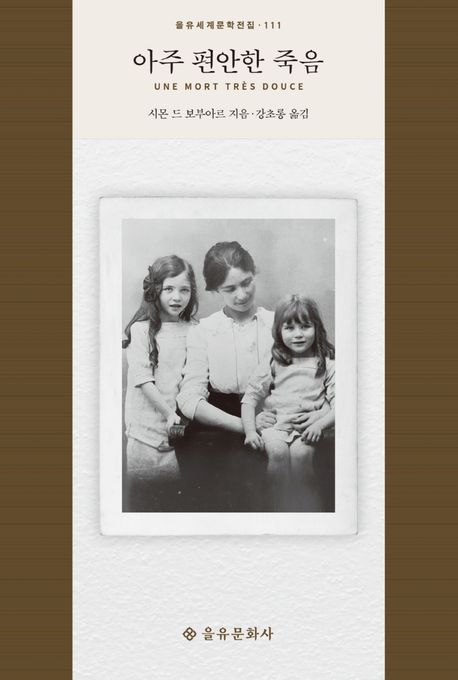
Quotes
정신이 혼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신다 해도 마찬가지일 거야”라고 동생에게 말했었다. 이날 밤 이전까지 내가 느꼈던 슬픔은 모두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었다. 심지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정신을 차린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느낀 절망감만큼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듯했다. 나는 사르트르에게 엄마의 입에 대해, 아침에 본 모습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 입에서 내가 읽어 낸 그 모든 것에 대해 들려주었다. 받아들여지지 못한 탐욕, 비굴함에 가까운 고분고분함, 희망, 비참함, 죽음과 대면해서뿐만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 내내 느껴 왔을, 하지만 털어놓지 못했던 고독함에 대해서. 사르트르에 따르면 내가 더 이상 입을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내 얼굴에 엄마의 입을 포개어 놓고 나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따라 했던 모양이다. 내 입은 엄마라고 하는 사람 전부를, 엄마의 삶 전체를 구현하고 있었다. 엄마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반박해 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주 많은 걸 얻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것이다. 다양한 욕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 내기 위해 엄마는 온 힘을 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분노를 느껴야만 했다. 엄마는 유년 시절 내내 규범과 금기라는 갑옷을 두른 채 몸과 마음, 정신을 억압당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끈으로 옭아매도록 교육받았다. 그런 엄마의 내면에는 끓어오르는 피와 불같은 정열을 지닌 한 여인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뒤틀리고 훼손된 끝에 자기 자신에게조차 낯선 존재가 되어 버린 모습이었다.
주사를 놓는 건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전날 밤에는 링거 장치의 한 부분이 고장 나는 바람에 관을 떼어 내고 혈관에 다시 주삿바늘을 꽂아야 했다. 야간 간병인이 혈관을 잘 찾지 못해 더듬댔다. 그 와중에 주사액이 살갗으로 흘러들어 갔고, 엄마는 상당히 아파했다. 간병인이 붓고 멍든 엄마의 팔을 붕대로 감쌌다. 오른쪽 팔에는 기계를 다시 연결했는데 엄마의 약해진 혈관은 혈청 주입을 근근이 버텨 내고 있었다. 하지만 혈장을 주입하자 엄마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질렀다. 저녁이 되자 엄마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밤중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그로 인해 아프게 될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링거액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 달라”며 애걸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엄마의 팔로 불안과 고통만이 가득한 생명이 흘러들어 가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금 스스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엄마의 삶을 연장해야 하는가?’
나는 호텔 프런트에 다음 날 아침 10시 반에 떠나는 비행기표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르트르는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 하루나 이틀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다시 볼 수 있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엄마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그것만은 견딜 수 없었다. 죽고 나면 기억이 없을 게 뻔한데도 왜 나는 잠깐이라도 엄마를 보는 일을 그토록 중시한 걸까? 회복하시지도 못할 텐데 말이다. 나름대로 해명해 보자면,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변치 않는 그 무언가를 새겨 넣을 수 있을 거라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싶다.
푸페트는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로 지냈다. 나 역시 혈압이 높아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다. 우리는 엄마가 임종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는 게 괴로웠다. 또한 그걸 지켜보면서 모순적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처지로 인해 특히나 힘들었다. 고통과 죽음 사이에 경주가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이 이기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죽은 듯 잠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시계를 매달아 둔 검은색 리본이 미미하게나마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게 위해 엄마가 입고 있는 하얀색 실내복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조심스레 관찰하곤 했다. 이게 마지막 경련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가 쪼그라들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나는 죽음을 목전에 둔 이 환자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오랫동안 속에 담아 둔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청소년 시절부터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된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너무나 닮은 탓에 끊어진 대화를 다시 이어 나갈 수 없었다. 그런 내가 엄마와 대화를 다시 나누게 된 것이다. 엄마가 몇 가지 단순한 말과 행동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식어 버렸다고 생각했던 엄마를 향한 내 오랜 애정이 되살아났다.
“의사들 말로는 촛불이 꺼지듯이 돌아가셨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동생은 흐느끼며 말했다. 간병인이 답했다. “하지만 보호자분, 제가 보증하건대 어머니께서는 아주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다양한 모양의 관이 찍힌 사진들을 보여 주었다.
자연스러운 죽음은 없다. 인간에게 닥친 일 가운데 그 무엇도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는 그 자체로 세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하지만 각자에게 자신의 죽음은 하나의 사고다. 심지어 자신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죽음은 하나의 부당한 폭력에 해당한다.